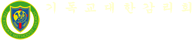이용도지묘李龍道之墓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pocmc 작성일18-07-19 13:09 조회2,4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마침내 광석동 막바지 목사님이 계시는 집이 보였다. 대문을 들어서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였다.
'울지 말자.'
나는 말없이 마루에 올라섰다. 그리고 역시 말없이 문을 그냥 열었다.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다.
7~8명이 앉아있는 한복판에 바로 이용도 목사님이 누워 계시지 않은가. 바로 옆에 같이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3년 전에 헤어졌던 이호빈 목사였다.
"아이구, 변 선생."
그의 큰 손이 덥석 내 손을 쥐었다. 그러더니 금방 나의 눈길을 눈치챈 듯, 누워 있는 이용도 목사님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니야, 용도 목사가 아니야. 형님 용채 씨야."
꿈결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아득했다. 정신은 다시 아찔해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울었다. 통곡했다.
***
얼마가 지났는지 모른다. 꽤 울었던 것 같다. 모여 있는 사람들과 목사님 부모님께서 말리며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았다. 수건 하나가 푹 젖었다. 목은 다 쉬었다. 울음이 어지간히 수그러졌을 때 송 부인의 가느다란 음성이 들렸다.
"전보를 치려다가 그만……" 하고 말을 잇지 못한다.
"전보를 해주자니까……."
역시 끝을 맺지 못하는 어떤 부인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 왔다. 학기 시험 중이기에 전보를 안 했다고 했다. 얼마 후에는 이런 말도 들려 왔다.
"이제야 사람 죽은 집 같구먼. 울음소리도 들리고, 알려 주지 않았다는 원망소리도 들리고……."
아, 이는 김영선 전도사의 음성이 아닌가. 목사님과 걸음을 같이 하기 위해 남만주까지 가서 결사적으로 전도를 다니다가 몸에 병까지 얻었다는……. 그러면서도 목사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 이 먼 원산에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목사님의 별세는 주님께서 불러가신 것이라고 해서 울음소리 한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처에 목사님의 친구가 많은데도 어느 한 사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곧 무덤에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졸랐더니 모두가 하나같이 반대하였다. 특히 호빈 목사는 극구 반대하였다.
"무덤에 가서 아주 죽으려는 모양이군."
그러나 나는 막무가내였다. 마침내 무덤에 가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는 맹세를 단단히 하고서 겨우 허락을 얻었다. 집을 떠날 때가 밤 12시 반, 그러니까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1시가 훨씬 지났을 것이다. 고기비늘 같은 구름조각이 수없이 흐르는 추석의 달밤은 어스름하기만 하였다. 산비탈은 어스름 속에 조용하였다. 산비탈을 기어오르는 나의 코에 흙 냄새가 확 들어왔다. 발걸음을 멈췄다. 붉은 흙이 달빛에 잠긴 무덤이 있었다. 희미한 달빛에 그 첫말의 글씨는 뚜렷하였다.
이용도지묘(李龍道之墓)
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다. 한참 후에 다시 말없이 일어선 나는 흙을 한줌 집어서 손수건에 쌌다. 달빛이 조금 환해졌다. 멀리 바다에는 작고 큰 불들이 무수히 널려 있었다. 저 멀리 등대가 눈에 들어왔다. 어디선지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윤선(輪船)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오, 여기, 바로 이 속에 우리 목사님이 묻혀 계시다니…….'
울컥 솟아오르는 무엇인가에 목이 꽉 막혔다.
'그렇게 사랑해주시고 그렇게도 잊지 않고 알뜰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털끝만치도 신세를 갚지 못한 이때에 이렇게도 야속하게 가시다니…….'
손발이 저려왔다. 나는 울 수도 없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나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막상 무덤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리려 하였을 때, 참았던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졌다. 비 오듯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산길을 내려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맥이 쭉 빠지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렇지만 눕고 싶지는 않았다. 더구나 새벽 6시 차를 타야 한다는 생각은 누울 만한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았다. 퍽 지난 후에야 좀 누웠다.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바로 그 자리에.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 나왔다.
날이 밝도록 흐르는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날이 밝으니 비로소 송 부인이 눈에 띄었다. 나는 얼른 외면했다.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어머님이 보일 때는 아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그저 울고 또 울었다. 얼마 후 나는 눈물을 닦으며 시험 때문에 6시 차로 꼭 가야겠다고 말했더니, 모두들 펄쩍 뛰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한데다, 잠까지 자지 못한 몸으로 이제 가다가 무슨 큰 일을 당하려느냐고 극구 말렸다. 아니, 아예 말조차 꺼내지도 말라는 기세였다. 거기에다 저녁차에 가는 영철이와 영옥이를 꼭 데리고 함께 가라는 간곡한 부탁에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온종일 나는 목사님이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장례식 전후
눈물 속에서도 송 부인과 잠시 얘기해 보았다. 운명 시부터 장례식까지 참여한 사람은 거기 남아있는 동지 몇 사람이 전부라고 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조문이나 조전이 얼마나 왔느냐?"고도 물었더니, 양주삼 총리사님과 평양의 송창근 박사에게서 온 전보가 고작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평양 송 박사의 조전에 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의 조전은 짧았다.
용도야, 너는 가고 말았는가.
우리 셋은 오후 3시 차를 타게 되었다. 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전송하러 역 구내에까지 들어왔다. 출발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이어 기차가 요란한 기적을 내뿜으며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영철이가 고개를 들며 밖에 서있는 사람들을 보다니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리 둘도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지었다. 순간 나는 큰 소리로 '이용도 목사 만세'를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꾹 참고 그만두었다.
나는 그때 일을 지금도 가끔 생각해본다. 어째서 이용도 목사 만세를 부르려고 했고 또 어째서 부르려던 만세를 그만두었는가.
차는 달린다. 날도 저물어 갔다. 저녁때가 된 것이다. 도시락 세 개와 차에서 파는 물 세 잔을 샀다.
"햐얀 찻잔 셋, 상복 입은 우리 셋과 신통하게도 같아 보이는구먼."
"에구, 그런 말씀은 왜 또……" 하며 영옥이가 눈을 감았다.
쌔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영철이가 잠이 든 모양이었다. 혼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곤히 잠든 영철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기차는 그냥 달리기만 했다. 어스름한 달빛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급기야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9시가 넘도록 졸며 흔들리고 있었다.
벌써 용산을 지난 기차가 경성역을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었다. 문득 어제 여기를 지나던 생각이 났다. 정말 감개무량했다. 역에 내렸을 때도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영철이를 영옥에게 맡기고 나는 신촌을 향했다.
숙사(宿舍)에 들어섰을 때는 밤 12시가 거의 다되었다. 맥이 다 풀려 자리에 눕기는 했으나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어지러웠다. 설령 잠이 온다 해도 내일 시험 칠 일을 생각한다면 잠을 자지 않아야 될 일이었다.
그래서 일어나기는 했다. 그러나 도무지 책을 볼 수가 없었다. 그저 눈이 가서 머무르는 곳은 목사님의 사진이 붙어 있는 바로 그 벽이었다. 쳐다보면 눈물이 나서 엎드렸다가도 다시 일어나면 또 눈이 가고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을 이렇게 밝히고 말았다.
아침에라도 책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저 마음이 끌려가는 곳은 거기뿐이요, 아무리 울지 않으려 해도 그저 눈물만 한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이러다가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없이 일어서서 그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렸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 사진을 종이로 싸고 꽁꽁 묶어서 고리짝 속 가장 밑바닥에 넣어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해뒀더니 이번에는 자꾸 고리짝으로 눈이 가며 눈물이 흘렀다. 한참 동안을 더 울고 고민하였다. 얼마 지나갔을 때에야 겨우 울음을 그칠 수가 있었다. 이러는 통에 책은 한 줄도 보지 못했다. 겨우 밥을 지어먹고 학교로 갔다. 물론 그날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른다. 그저 눈물 속에서 넘어간 시험이었다.
(계속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